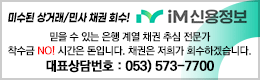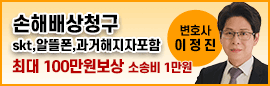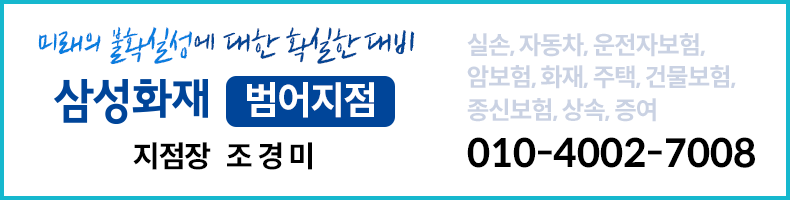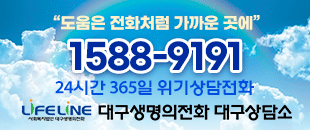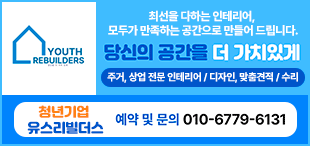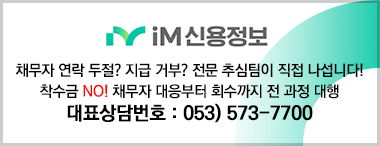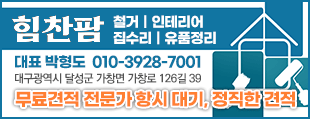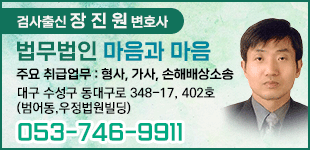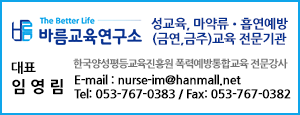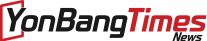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갭투자가 어렵게 되면서 공급이 줄고 결국 전세 시장에서 밀려난 임차 수요가 부득이하게 월세로 넘어갈 것이란 우려다. 임대차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서민의 주거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줄었다.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인 반면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이었다. 이번 대책으로 한도가 줄면서 수도권 내 전세대출을 받은 3분의 1가량은 평균 한도가 6500만원 줄어든다. 현재 수도권에서 1주택자 가운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약 5만2000명이다. 이 중 2억원 이상에서 3억원 미만 금액을 빌린 이들은 1만7000여명으로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이번 대책으로 돈을 빌린 후 갭투자를 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주택 보유자가 자신의 집에 살지 않고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하고, 이후 전세 대출을 통해 다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어려워졌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서도 갭투자를 제한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이는 집을 사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집을 산 뒤 전세를 줄 수가 없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했다. 은행에서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인데 통상 분양 아파트의 집 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거나 할 때 활용하던 방식이다. 갭투자에 제동을 건 것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적은 돈으로, 능력 이상으로 집을 사는 걸 어렵게 하려는 의도다.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봤다.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월세 갈아타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 전셋값이 오르고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월세 시장으로 떠밀리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청년이 받는 버팀목 전세대출 등 한도를 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 기준 90%에서 80%로 낮췄다. 전세 대출에 제동을 건 것은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이를 통해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올해 7월까지 누계 상승률은 1.24%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 0.54%, 전국 0.12%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갭투자를 제한하기 시작한 지난 6월부터 상승률이 높았는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6월 0.33%, 7월 0.31%로 나타났다. 6·27 대책이 나온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2.3%였는데 다음 달 44.1%로 1.8%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