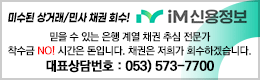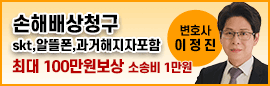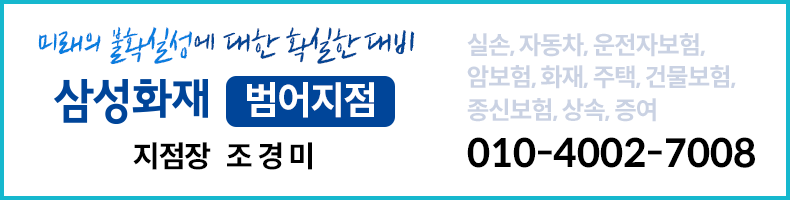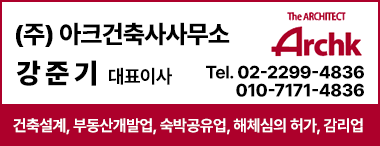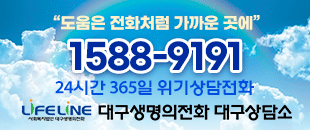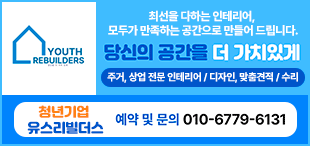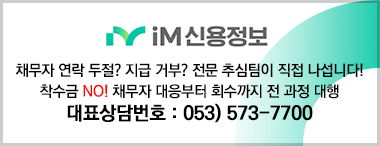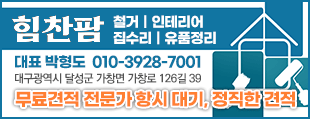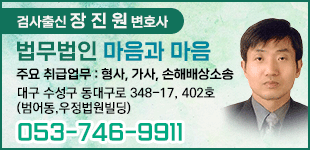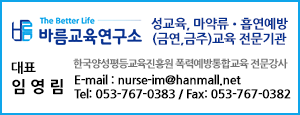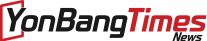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경매에 넘어간 전국 아파트는 3510건으로 4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자부담에 허덕이면서 급매로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사실상 ‘서민 파산’도 최고 기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유동성이 막힌 건설사는 스스로 문을 닫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돈줄이 마르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이들이 아파트를 경매 시장에 내놓게 된 것이다.
빚을 갚지 못해 급매로 나오는 아파트도 늘면서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10억원 아래로 내려갔다. 1년 10개월 만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8월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집값이 뛰면서 금융 불균형이 커졌다”면서 금리 동결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은 이후 급격히 달라졌다. 당장 지난달 서울에서만 폐업신고를 한 종합건설업체가 17곳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회사 수는 전국에서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회사는 516곳으로 전년(418곳)대비 23.4%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022년 261곳에 비하면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반면 2022년 5146곳에 달했던 신규등록 종합건설회사는 2023년 1307곳으로 크게 줄더니 지난해는 434곳으로 또다시 1년 전보다 66.79% 줄어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은 ‘고금리 시대’로부터 등 돌릴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짚는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서며 금융안정을 헤쳐, 통화정책 전환을 주저하게 했던 1년 전 상황과는 다르단 지적이다.
건설업이 무너지면 주변 산업도 빠르게 위축된다. 부동산 중개업체, 이사 업체, 인테리어 업체, 가구·가전업체 등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받는 업종들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업종이기도 하다.
실제 통계로 살펴도 소비재 중 가전 제품 수요 둔화가 뚜렷히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가전제품 소매 판매액은 코로나19 첫해인 2021년 38조2080억이던 것이 2022년에는 35조8073억, 2023년에는 32조4611억으로 줄어들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침체 이면엔 오래도록 유지된 높은 수준의 금리가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는다. 실제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에 직면엔 건설업계엔 자금조달 비용을 높인 고금리 상황이 유동성 악화를 불러온 것으로 지목된다. 시행사들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PF과정에서 수익률이 내려가다 보니 사실상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다고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