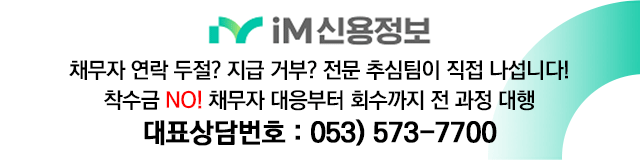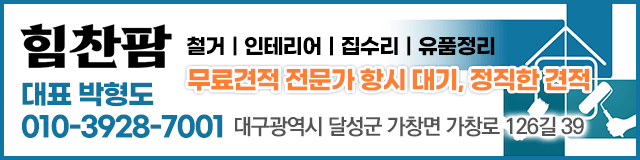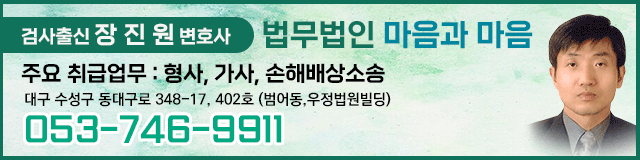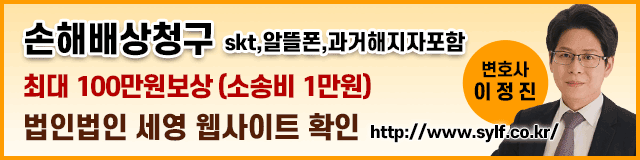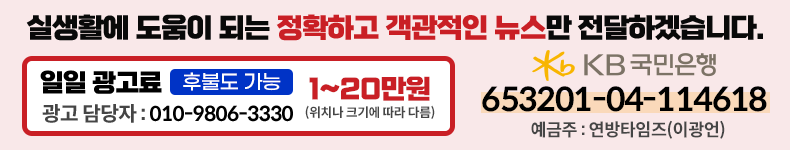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병원에 다녀온 지 4개월 뒤 날아온 고지서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병원비 청구 시스템
실리콘밸리에 거주 중인 박미쉘 씨는 최근 입 주위에 염증이 생겨 인근의 긴급 진료 클리닉(Urgent Care)을 찾았다. 진료는 단 몇 분이면 끝났고, 의사는 간단히 “구각염입니다. 처방전 하나 써드릴게요”라는 말을 남겼다. 병원을 나서며 박 씨가 지불한 금액은 약 7만 원(50달러).
문제는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에 발생했다.
병원으로부터 추가로 날아온 청구서는 총 55만 원(약 380달러)에 달했다. 이미 당일 진료비를 지불한 상황에서, 남은 금액 중 본인 부담금으로 50달러를 다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고지서에는 "14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및 추가 비용 청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다.
박 씨는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진료 전에 대략 얼마가 나올지 짐작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최종 병원비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몇 달에 걸쳐 청구서가 따로따로 오니 그때마다 불안해진다”고 덧붙였다.
진료는 간단한데, 비용은 왜 복잡한가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은 그 복잡성으로 악명이 높다. 보험은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와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PPO는 원하는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가 높고, HMO는 보험료가 낮은 대신 반드시 주치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 구조뿐만 아니라, 보험의 **등급(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에 따라 보장 범위, 공제금(deductible), 본인 부담금(copay) 등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 환자는 물론 병원 직원조차도 정확한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렵다.
진료비 청구 역시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의사 진료비, 검사비, 처방전 비용 등이 제각각 청구되며, 이 과정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리는 일이 흔하다. 그동안 환자는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순차적으로 받아들게 되는 셈이다.
의료비는 파산의 씨앗이 될 수도
미국에서 의료비는 단순한 생활비의 차원이 아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개인 파산의 약 70%가 의료비와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다. 박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며, 병원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몇 달 뒤 갑자기 거액의 청구서를 받는 구조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절실히 느꼈다”고 전했다.
의료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구조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치료 과정뿐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환자가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미국 의료 시스템은 그 기본적인 신뢰의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